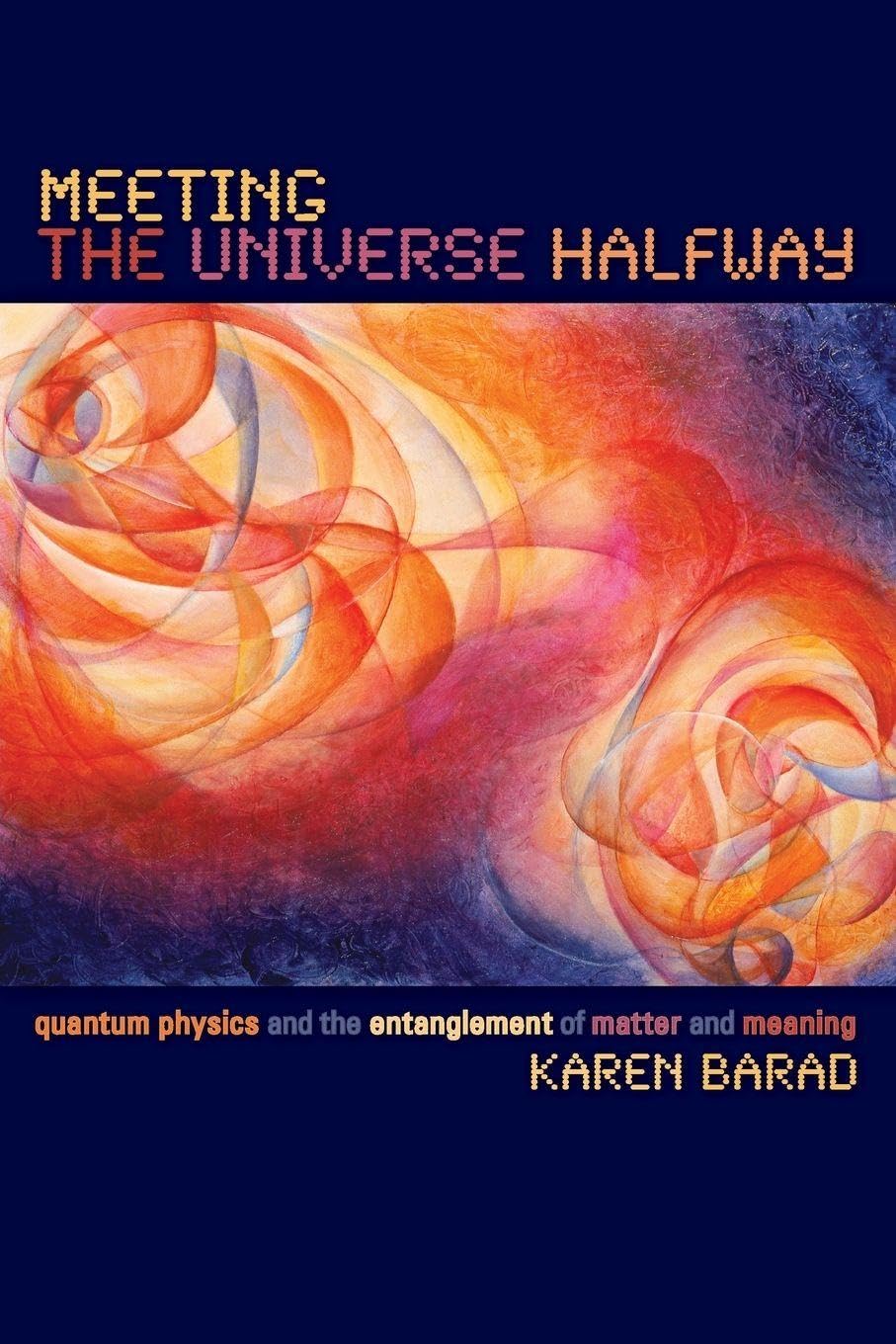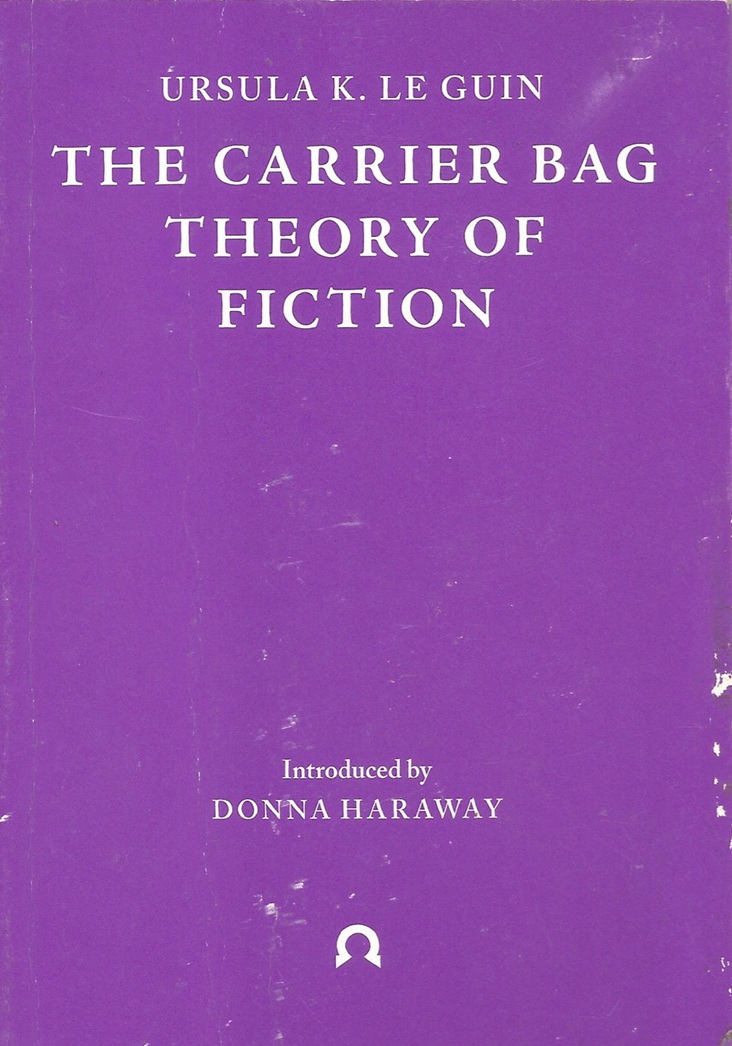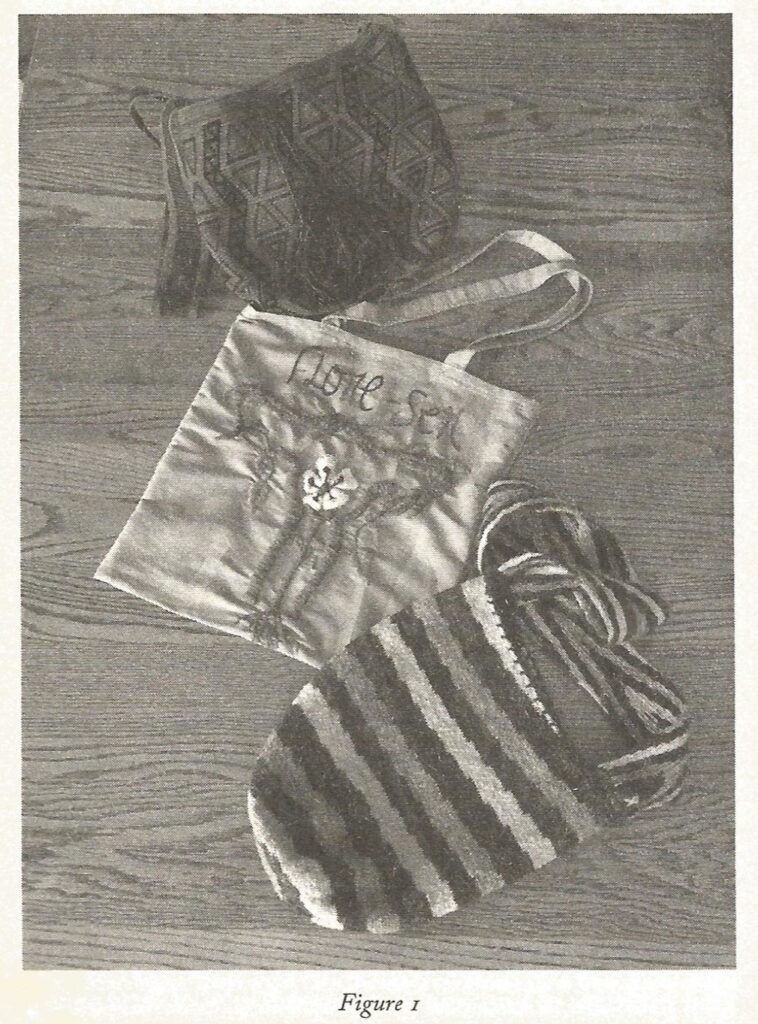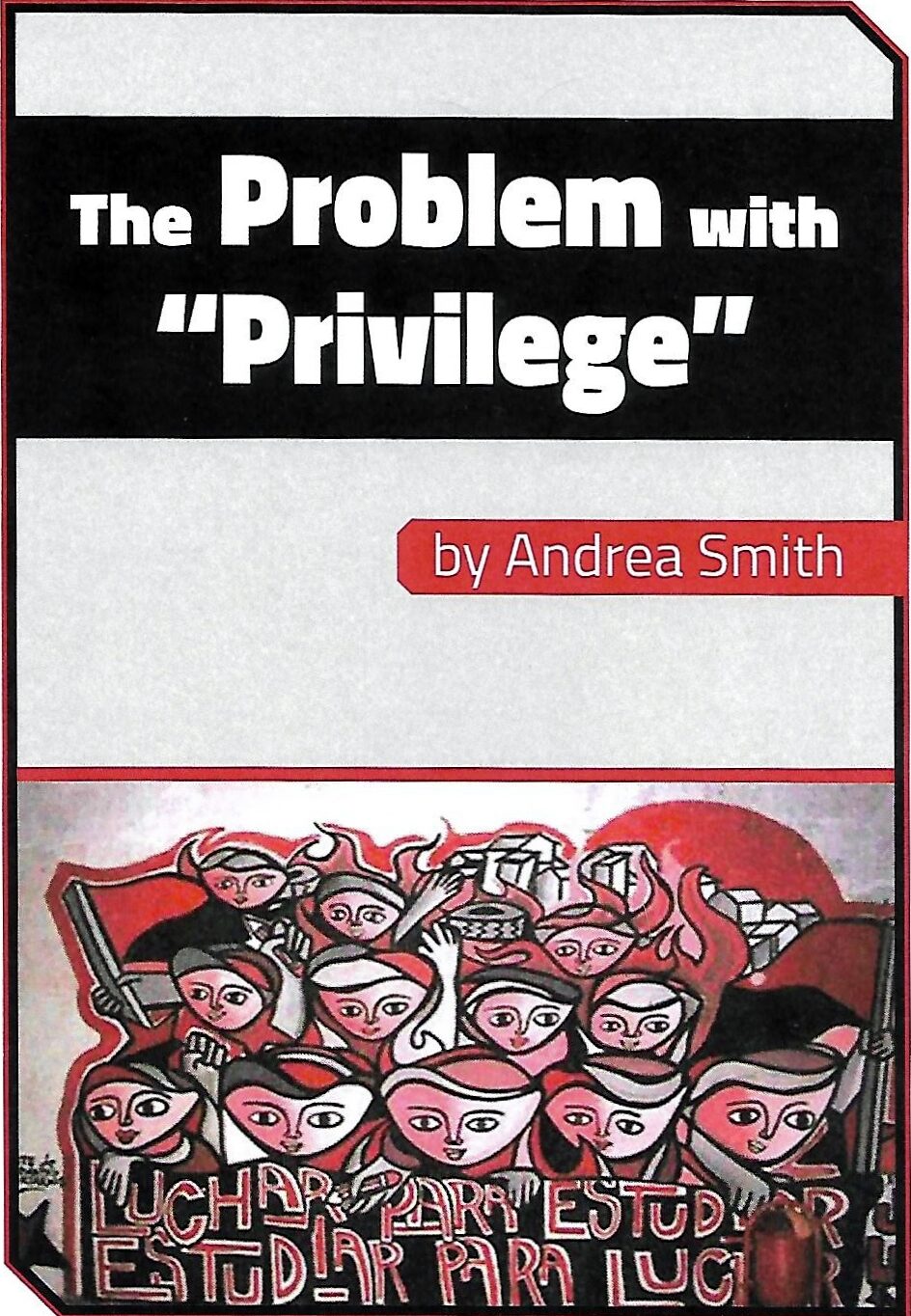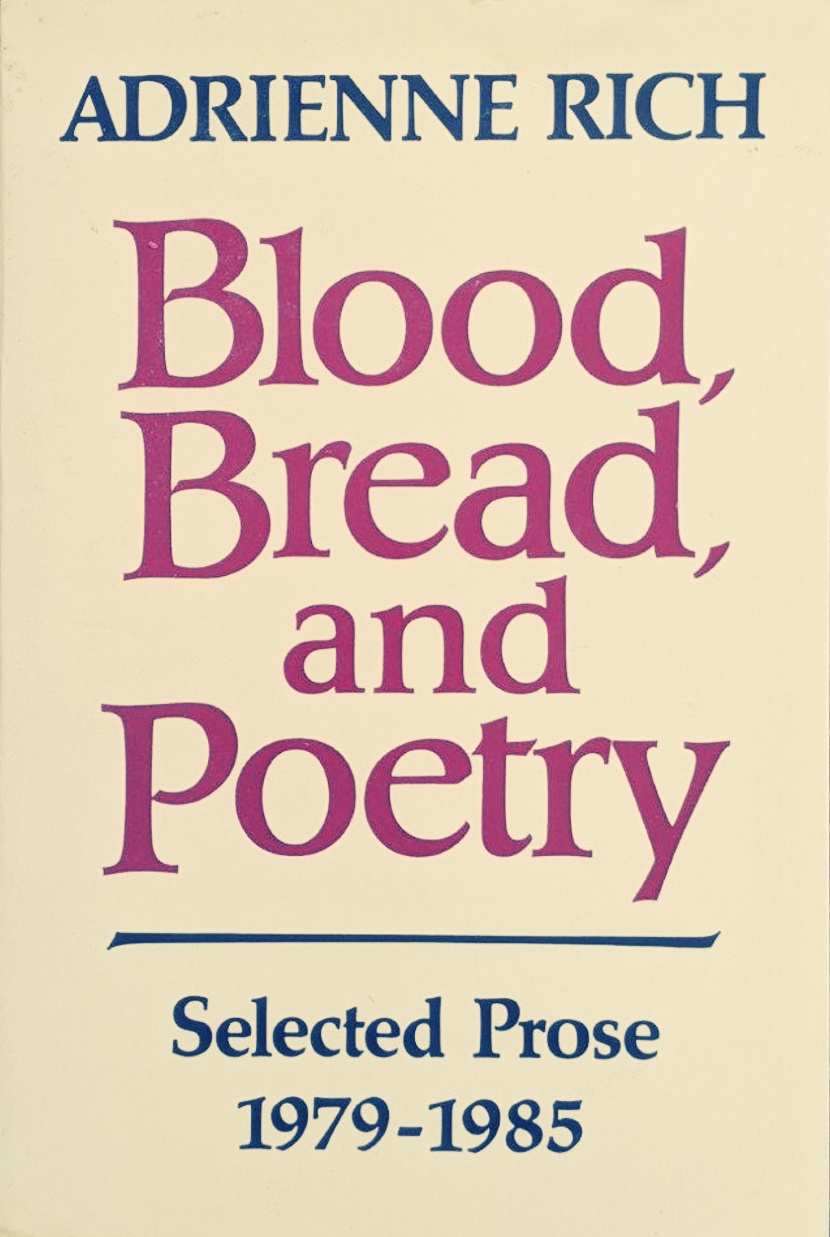Toward a More Feminist Criticism (1981)
더욱 페미니즘적인 비평을 향하여 (1981)
에이드리언 리치 (부깽 옮김)
나는 비평을 필요로 하는 작가로서, 때로 비평을 쓰기도 하는 문학도로서, 작은 레즈비언-페미니스트 저널 『Sinister Wisdom』의 공동 편집자로서, 그리고 몇 주 전 워싱턴 D.C.에 모여 스스로를 ‘출판계의 여성들(Women in Print)’이라고 규정한 페미니스트 혹은 레즈비언 편집자, 인쇄업자, 서점 운영자, 출판인, 기록관리자, 비평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과업에 임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특히 그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함께 엮고자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생존의 문제를 다루려는 과정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레즈비언 및 페미니스트 구성원들과 함께 사유하고 길러온 것이다.
그 회의의 첫 번째 소집 공고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었다. “여성운동의 생존은, 다른 모든 혁명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통망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 그 소통망의 한 부분으로서, 더 많고 더 나은 비평의 필요성이 우리의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비평이라 부르는 활동에는 사실상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학, 주로 여성학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며, 일차적으로 그 내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비평은 기존의 정전(canon)에 무리 없이 편입될 수 있는 과거의 작품이나 상업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동시대 작품에 집중한다. 또 다른 유형은 때로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들에 의해 쓰이기도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어조·언어·스타일의 차이를 수반하는 더 넓은 페미니스트 공동체에 기반을 둔다. 첫 번째 유형의 비평은 『Signs』, 『Women’s Studies』, 『Feminist Studies』와 같은 저널뿐 아니라, 때로는 『College English』, 『Parnassus』와 같은 비(非)페미니스트 문학·비평 저널이나 전문 계간지에 실린다. 두 번째 유형은 『Conditions』, 『Feminary』, 『The Feminist Review』, 『off our backs』, 『Sinister Wisdom』 등의 잡지뿐 아니라 『First World』, 『Radical Teacher』, 『Freedomways』, 『Southern Exposure』 등에도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첫 번째 비평이 두 번째 비평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열이다.
서구 문학 문화에 잘 알려진 한 분열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중산층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문학적 ‘기득권(establishment)’과, 확고히 자리 잡은 사상과 형식에 도전하고 규칙을 무시하며 ‘약강격(iamb)을 부수고’, 현재의 기득권 양식에 반대하는 ‘소(little) 잡지’를 펴내는 ‘아방가르드(avant-garde)’ 사이의 분열이다. 문학적 ‘아방가르드’는 종종 정치적으로도 급진적이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예를 들어 남부의 퓨지티브 운동(Fugitive movement)이 급속히 하나의 기득권으로 변모한 것처럼) ‘모더니스트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반항적인 미학 속에서 보수적에서 파시즘에 이르는 정치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페미니스트 비평은 문학 비평의 한 학파로서가 아니라, 1970년에 출간된 케이트 밀렛(Kate Millett)의 기념비적 저서 제목처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학을 성 정치학(sexual politics)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정치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위로서 시작되었다. 밀렛은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 에세이는 문학 비평과 문화 비평이 동등하게 결합된, 어쩌면 일종의 혼종이자 완전히 새로운 변종에 가깝다. 나는 문학이 구상되고 생산되는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을 비평이 고찰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업해왔다. 문학사에서 비롯된 비평은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고찰을 수행할 수 없으며, 미학적 고려에서 출발한 비평, 즉 ‘신비평’은 애초에 그러려 한 적이 없다.¹
페미니스트 비평은 미인대회에서부터 대학 교재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을 그것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성찰한 여성 해방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77년 에세이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을 향하여(Toward a Black Feminist Criticism)」에서 바바라 스미스(Barbara Smith)는 이렇게 말한다.
책이 실제로 존재하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책이 이해되려면 적어도 작가의 기본적인 의도가 고려되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1970년대에 구체적인 페미니스트 비평이 등장하기 전까지, 백인 여성들의 책은 …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화적 표상으로 명확히 인식되지 못했다. 가부장적 가치와 관행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놀라울 만큼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백인 여성의 문학이 여성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북미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2물결이 표면화된 이후였다.²
이 진술을 염두에 두고, 나는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을 여성 해방 운동, 곧 혁명적인 운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비평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단순히 여성 글쓰기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인식 없이 여성이 다른 여성의 책에 대해 쓰는 것이나, 지성의 자유주의적 슈퍼마켓에서 여성적 ‘대안적 읽기’에 그친다고 여기는 저자에 의한 것이나, 백인성·이성애·학문적 연구의 규범이 본질적으로 완전한 시각을 제공한다고 받아들이는 저자에 의한 것은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책을 읽고 쓰거나, 아무리 취약하게나마 학계에 몸담은 여성들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삶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책무성을 전제로 한 페미니스트 비평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계 페미니스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여성들에게 이는 학계 문화의 규범이자 그 너머 지배 문화의 규범인 ‘보편적 백인성’을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학습을 포함하며, 동시에 ‘보편적 이성애’라는 규범을 벗어나려는 학습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 작업에 없는 포괄성을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유색인 여성 및/혹은 레즈비언을 암시하는 장이나 문단, 각주를 의례적으로 덧붙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백인성과 이성애의 보편성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10여 년 전 가부장적 가치와 관행에 도전하며 겪었던 것만큼이나 급진적이고 놀라운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것이야말로 페미니스트 비평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이며,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백인 학계 페미니스트들의 문학 비평을 볼 때, 그들이 백인 남성 비평가들의 저작을 대거 인용하는 것에 종종 놀라게 된다. 그리고 그 인용과 함께 자주 드러나는, 이 신사들과 논쟁해야 한다는 듯한 방어적 어조와, 페미니스트를 더 넓은 여성 공동체와 연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여성으로 고립시키는 대화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태도에도 놀라게 된다. 나는 일종의 근본적인 긴장도 느낀다. 그것은 더 나아가야 할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하는 긴장이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용감하게 페미니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 긴장이며, 눈에 띄는 “신랄함” 없이 동료적인 농담을 주고받아야 하는 긴장이고, 문학비평의 언어와 방법을 동원해, 대부분 백인인 여성 작가들을 늘 ‘다뤄야 할 텍스트’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긴장이다. 나는 학계에서 이성애자로 수년간 살아온 백인 중산층 여성으로서, 이 긴장을 내 안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양쪽을 다 취하려는, 즉 호감을 주면서도 대담하려는 긴장이며, 토큰(token, 구색 맞추기용 인물)이면서도 토큰처럼 행동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나는 이런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문학을 비평하는 페미니스트 비평가에게 문학 해석 훈련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에 기반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여성이 쓴 책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신문과 정기간행물, 팸플릿, 기사, 그리고 여성폭력,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직장 내 성적·경제적 투쟁, 강제 불임 시술, 근친상간, 교도소 내 여성에 관한 연구들을 읽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미니애폴리스의 클레이스 출판사(Cleis Press)에서 출간된 남성 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저항을 다룬 앤솔로지 『Fight Back! 맞서 싸워라!』, 셰리 모라가(Cherrie Moraga)와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가 엮고 퍼세포니 출판사(Persephone Press)에서 출간한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내 등골이라 불린 다리: 급진적 유색인 여성들의 글』, 2월 3일 출판사(February 3 Press)에서 출간된 『Top Ranking: Racism and Classism in the Lesbian Community 톱 랭킹: 레즈비언 공동체의 인종주의와 계급주의』, 나이아드 출판사(Naiad Press)에서 출간된 J. R. 로버츠(J. R. Roberts)의 『Black Lesbians: An Annotated Bibliography 흑인 레즈비언: 주석이 달린 참고 문헌』와 같은 페미니스트 출판물들도 포함된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작업 또한 하나의 잠재적 자원, 곧 우리를 위한, 우리 운동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를 단지 다른 비평가나 학자들을 위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책을 ‘실재하고 기억되도록’ 만들며, 평범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놓치거나 외면했을 글을 읽도록 고무하고, 릴리언 스미스(Lillian Smith)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말이 우리를 속박하고 어떤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가려내는 일을 돕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기반을 둔 최근의 도발적인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얀 클라우센(Jan Clausen)은 운동 내에서 시와 시인이 맡은 두드러진 역할이 일부 여성들로 하여금 말과 언어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부여하게 만들었으며, 조직가나 실천적 전략가보다 시인을 대변인의 위치로 격상시켰다고 지적한다. “페미니즘은 말뿐 아니라 행동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³ 나 역시 행동을 등한시한 채 언어에 심취하는 운동에 대한 클라우전의 불편함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나는 종종 대변인의 역할을 부여받는 시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시적 언어에 주어지는 의례적인 동의의 수준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듣고 글로 쓰며 어쩌면 대상화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한 친구는 그것을 ‘신뢰 없는 동의(assent without credence)’라고 정의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얼마나 깊이 분별 없는 박수와 찬사, 그리고 진정한 비판적 응답이 부재한 경험을 가혹하게 느껴왔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일 것이다. 물론 내가 시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반응을 믿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연결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지 않으며, 시인이 반드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실 시를 낳는 것은 오히려 행동일 수도 있다. 시인은 자신과 같거나 다른 사람들, 즉 억압적인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행위가 말로, 행동이 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투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결국 누구와 말하고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말을 빗나가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사소화(trivialization)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의례화된 존중(ritualized respect)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의 양분과 섞이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비판은 스스로를 작가로 규정하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작품을 자신의 경험이라는 잣대로 검증할 여성들로부터도 나와야 한다. 이들은 버지니아 울프의 ‘보통 독자’처럼 문학을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모든 페미니스트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진정한 비평을 갈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다. 단순히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인의 언어와 이미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문을 던지는 분석 비평을. 남부의 레즈비언-페미니스트 저널 『Feminary』에서 수전 우드-톰슨이 내 시 속 ‘맹목’의 이미지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또한 내 작품에서 내가 단지 잘 할 줄 아는 것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표현상의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비평의 일부는 친구들에게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원칙에 입각한 비평이 낯선 이들로부터도 온다면 모든 페미니스트 작가들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을 넓혀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비평은 문학 자체에 대한 헌신뿐 아니라 독자들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여성 독자들만이 아니라, 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에게까지 읽기와 쓰기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헌신이기도 하다. 흑인 비평가 글로리아 T. 헐(Gloria T. Hull)은 사유를 자극하는 아름다운 에세이 「앨리스 던바-넬슨 연구하기(Researching Alice Dunbar-Nelson)」에서, 페미니스트 학자로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모색하는 자신의 여정을 그린다. 그녀는 부모, 형제, 연인, 학문적 동료, 다른 흑인 페미니스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말을 건네고자 하는 다양한 독자들을 상상하며, “두세 개의 다른 모자를 쓴 채 교활하고 분열적인 에세이를 쓰기보다” “유기적인 글”을 쓰고자 했다고 말한다.⁴ 이 에세이에서 헐은 던바-넬슨의 생존 조카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자료를 다루는 과정, 그 조카딸과 맺은 관계의 역학, 그리고 이 연구와 그 발견이 자신의 삶과 흑인 여성 작가 연구 전반에 갖는 의미를 서술한다. 글의 말미에서 그녀는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 방법론의 원칙을 정리한다. 나는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1) 대상에 관한 모든 것은 그녀의 삶과 작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2) 올바른 학문적 태도는 ‘객관적(objective)’이라기보다 ‘참여적인(engaged)’ 것이다.
(3)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 이는 대상과 비평가 모두에게 해당된다.
(4) 기술(description)은 반드시 분석을 동반해야 한다.
(5) 흑인이자 여성인 시각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계급의식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6)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엄격한 진실성과 ‘모든 것을 말하기(telling it all)’를 요구한다. [여기서 헐은 던바-넬슨의 일기를 편집하며 그녀의 레즈비언 관계를 발견한 사실을 포함해 여러 점을 암시하고 있다.]
(7) 연구와 비평은 학문적·지적 유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뿌리내린 사회적 의미를 지닌 추구이다.
나는 항상 던바-넬슨이 우리에게 할 말이 많으며, 더 중요하게는, 그녀를 정직하게 다루는 것이 은유를 넘어선 의미에서 어떤 흑인 여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마치 이런 방식으로 그녀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다.⁵
그리하여 질문은 우리 앞에 놓인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비평이 대학 안에서, 혹은 학술 출판물을 통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예를 들어, 내 작업이 레즈비언의 작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학술 강의실과 논문 속에서 정중하게 인용되고 논의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기서는 레즈비언이라는 말 자체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바바라 스미스의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을 향하여」, 앨리스 워커의 에세이/묵상 「자신만의 아이(One Child of One’s Own)」가 발표된 지 몇 해가 지나고,『Signs』가 내 글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를 게재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Signs』의 최신호가 “사유 자체를 재사유하기”를 페미니즘 사상의 핵심으로 주장하는 장문의 논문으로 시작하면서도, 백인 중심적이고 이성애적인 여러 학계 페미니스트 비평서들을 아무런 언급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⁶ 『Feminist Studies』에 실린 유사하게 야심적인 논문이 “유색인 여성 혹은 명시적으로 레즈비언인 여성들의 작업에 대한 언급 없이”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⁷ 비평가가 단지 백인 중심적이며 이성애적인 경험과 독서의 단면만을 토대로 포괄적인 이론을 구축하려 할 때, 그녀가 사유를 구성하는 바로 그 개념과 구조에 대해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또한 백인 학계 페미니스트 비평가가 앨리스 워커, 바바라 스미스, 엘리 벌킨(Elly Bulkin), 미셸 러셀(Michele Russell), 토니 케이드 밤바라(Toni Cade Bambara)의 작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녀는 『Conditions』, 『First World』, 『Freedomways』, 『Radical Teacher』, 『Sinister Wisdom』 같은 저널들에서 그들의 비평을 찾는가? 아니면 문학 비평가로서 『Partisan Review』, 『Critical Inquiry』, 『Semiotics』, 그리고 여러 영문학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을 꾸준히 따라잡는 일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그들의 기준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까지 흡수하고 있는가? 왜 많은 학계 페미니스트 비평의 언어는 그렇게도 냉정하고 명석하며, 매끄럽고 세련되어 보이는가?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가 글로리아 T. 헐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거부해 온 비평의 문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전통적인 백인 남성 문학 연구의 특징인, (내가 몹시 싫어하는) 거만하고 재치 있지만 공허한 영국식 세련된 어조에 대한 (과잉된) 반응으로서, 나는 대개 던바-넬슨을 한결같이 진지하게, 그리고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논의한다.⁸
자신의 작업이 “‘현실 세계’에 뿌리내린 사회적 의미를 푸구하는 것”이라고 믿는 페미니스트 비평가에게 필수적인 것은 권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대학을 통해 배분되는 문화가 어떻게 어떤 이들에게는 힘을 부여하고(empower) 다른 이들에게는 힘을 빼앗는지(disempower), 그리고 그녀 자신이 피부색, 이성애성, 경제적·교육적 배경 혹은 그 밖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성찰되지 않은 특권의 위치에서 글을 쓰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그랬듯이) 흑인 여성 작가의 소설에 대해 쓴다면, 그 소설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백인·중산층·유대인·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서의 해석, 즉 복합적인 관점이지만 결코 권위 있는 관점은 아님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백인으로서 나는 이 문학이 나에게 미친 영향과 인상을 설명하고, 왜 다른 백인 여성들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하려는 시도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조망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경험과 연구가 결합되어 나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과 인식을 지닌 흑인 여성 학자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내가 백인이기 때문이고,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며, 학자나 비평가, 시인, 소설가로서의 유색인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의 특권, 나아가 나의 신뢰성을 지탱하는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백인 피부, 이성애, 계급적 배경이라는 모든 혹은 많은 특권을 가진 여성이 그로 인해 글을 쓰거나 비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모든 여성이 동일한 특권을 지닌 것처럼 읽고, 생각하고, 쓰고, 행동하지 않을 책임이 있으며, 특권이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부여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타협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앉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매우 다른 문화적 배경이나 근원에서 글을 쓰는 여성들의 작품을 마주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혼란스러움이나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를 포함하도록 결코 설계되지 않았던 전통, 곧 읽기, 말하기, 쓰기, 비평하기의 방식이 지닌 한계를 거부하는 일에서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
물론, 그 전통, 즉 학계의 관점에서라면 다른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고 실제로 매일 제기된다. “당신은 문학을 정치적 변화의 바람에 책임지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정치와 예술은 언제나 재앙적인 동반자가 아니었나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작가의 개인적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당의 노선 같은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작품을 평가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결코 보이는 것처럼 순수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유색인, 가난한 사람들, 백인 여성,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들의 자기 규정과 자기 사랑에 깊이 적대적인 지배적 백인 남성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술이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할 수 있을까?”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다. 이는 누가 만들도록 허락받았는지, 무엇이 그것을 존재하게 했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정전(canon)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전히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나는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자각하는 동시에, 우리 사이의 차이 또한 깊이 인식하는 여성 운동,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을 전제로 삼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며, 그에 따라 문학에 관한 질문들 자체가 새로운 질문들로 변한다고 믿는다.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가 메리 헬렌 워싱턴(Mary Helen Washington)이 흑인 여성에 의한, 그리고 흑인 여성에 관한 소설 선집 『Midnight Birds』에 흑인 레즈비언 작가의 단편을 (그 정체성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 한 편 포함시키고, 서문에서 흑인 레즈비언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때, 그녀는 비평가로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한 것이다. 백인 페미니스트 비평가가 유색인 여성을 자신의 분석에 별도의 장이나 각주로 단순히 덧붙이거나, 아예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때, 그녀는 단순히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녀의 비평의 유기적 짜임은 바로 그 왜곡으로 인해 약화된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백인 중심적 독단의 관점을 벗어나 작업하려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분석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유색인 여성의 글뿐 아니라 백인 여성의 글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더 멀리 보게 될 것이다.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에 대한 의식은 단순히 인종차별적 언어나 동성애 혐오적 고정관념을 삭제하려는 노력(물론 그것이 필요한 시작점이긴 하지만)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비평이라는 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작업이며, 백인성과 이성애를 절대적 권위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상태로 경험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고, 익숙한 자아와 새로 드러나는 자아 사이에서 분열감을 느끼게 한다. 검증되지 않은 충성심에 의문을 품게 하며, 즐거운 동료 관계나 농담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과거 글을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읽게 만들고,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탐구의 주제 목록을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우리가 문학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Women in Print’ 컨퍼런스의 몇몇 워크숍에서 나는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아직 창조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문학이 묘사되는 것을 듣고 있다고 느꼈다. 유색인 여성들과 백인 여성들은 소설가로서든 비평가로서든, 자신과 다른 여성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차이들이 여성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가?”라는 물음도 던져졌다. 우리는 비평가나 리뷰어가 자신의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어떻게 기르고, 자신이 비평하려는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또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가가 단지 자신의 계급이나 배경에 속한 여성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향해 책무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온전한 인물을 창조하려 애쓰는 일이 어떻게 단지 글쓰기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문학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비가시성과 왜곡된 재현을 보상하려는 충동, 피부색이 검거나 레즈비언 혹은 그 둘 다인 ‘문학적 슈퍼우먼’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페미니즘 버전을 거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 워크숍에서는 두 명의 백인 맹인 레즈비언, 한 명의 푸에르토리코 레즈비언, 한 명의 흑인 레즈비언, 그리고 한 명의 백인 노동계급 레즈비언이 문학 속에서 자신과 같은 여성들을 발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항상 전면에 나서는 것만이 아니라, 배경에서도요. 그 장면의 일부로서, 거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둡거나 밝거나, 장애나 나이, 혹은 신체 이미지에 관한 고정관념을 벗어난, 경직되고 환원적이며 반복적인 이미지 만들기를 넘어서는 시적·산문적 언어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평가의 과제 중 하나가, 독자이자 작가로서 우리 앞에 그러한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 두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영문학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 영어로 쓰인 “주요 비평 텍스트들”이 여럿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영국 남성들이 쓴 것이었고, 필수적인 고전으로 여겨졌다. 시드니의 『시의 옹호』, 워즈워스의 「서정 민요집 서문」, 콜리지의 『문학 평전』 서문, 엘리엇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 엠슨의 『일곱 가지 유형의 모호성』 등이 그 예였다. 그리고 그 목록은 지난 30년 동안 더 길어졌다. 이 강연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현재의 미국 페미니즘이 불과 십여 년 만에 그에 견줄 만한 중요한 비평 텍스트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확장된 의미에서 문화 비평이기도 했다. 『성 정치학』이 그 야심찬 종합과 높은 가시성을 통해 길을 열었다면, 바바라 스미스의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을 향하여」는 기존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인 페미니스트 비평과 흑인 문학 비평 양쪽의 심장부를 찌르는 대립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다음 단계였다. 나는 맵 시그레스트의 「남부 여성 글쓰기: 온전함의 문학을 향하여」, 여기서 인용한 얀 클라우전과 글로리아 T. 헐의 글, 엘리 벌킨이 『레즈비언 소설』과 『레즈비언 시』에 쓴 서문들을 떠올린다. 또한 앨리스 워커의 「우리 어머니들의 정원을 찾아서」와 「자신만의 아이」,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방언으로 말하기: 제3세계 여성 작가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레즈비언-페미니스트 문학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아리나 클레피시의 「레이철 로봇닉의 일기」를 생각한다. 나는 학계의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가들이 운동 내 활동가이기도 한 비평가들이 제기한 물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 또 학계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Azalea』, 『Conditions』, 『Feminary』, 『Sinister Wisdom』과 같은 저널들을 찾아 읽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바란다. 그것들은 단일한 노선을 추구하는 일체화된 매체가 아니라, 지배적인 문학 비평의 활동과 그것이 반영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강력하고 전복적인 역사적 주체들이며 교실에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페미니스트 비평이 우아하고, 호감을 사고, 존경받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고, 그 대신 강인하고, 거침없으며, 위험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대학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정치적 힘으로서, 그리고 우리 운동의 생존을 위한 소통망의 일부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모두, 작가, 비평가, 편집자, 학자, 조직가, 서점 운영자, 인쇄인, 출판인, 학생, 그리고 교사가 서로의 작업이 지닌 힘을 나누기를 바란다.
페미니스트 문학 연구 심포지엄 기조연설, 미네소타 대학교, 미니애폴리스, 1981.
각주
- 케이트 밀렛 (Kate Millett), 『성 정치학 (Sexual Politic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p. xii.
- 바바라 스미스 (Barbara Smith),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을 향하여 (Toward a Black Feminist Criticism),” 모든 여성은 백인이고, 모든 흑인은 남성이고,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용감하다: 흑인 여성 연구 (All the Women Are White, All the Blacks Are Men, but Some of Us Are Brave: Black Women’s Studies), 편집: 글로리아 T. 헐, 패트리샤 벨 스콧, 바바라 스미스 (Old Westbury, NY: Feminist Press, 1982), p. 154.
- 얀 클라우센 (Jan Clausen), 『시인의 운동 (A Movement of Poets)』, pamphle (Brooklyn, N.Y.: Long Haul, 1981).
- 글로리아 T. 헐 (Gloria T. Hull), “앨리스 던바-넬슨 연구하기 (Researching Alice Dunbar-Nelson),” 모든 여성은 백인 (All the Women Are White), pp. 193-194.
- Ibid, p. 193.
- 마이라 젤렌 (Myra Jehlen), “아르키메데스와 페미니스트 비평의 역설 (Archimedes and the Paradox of Feminist Criticism),”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6, no. 4 (Summer 1981): 571-600.
- 주디스 가디너 (Judith Gardiner), 엘리 벌킨 (Elly Bulkin), 레나 그라소 패터슨 (Rena Grasso Patterson), 애넷 콜로드니 (Annette Kolodny), “페미니스트 비평에 관한 교환: ‘지뢰밭을 뚫고 춤추기’에 대해 (An Interchange on Feminist Criticism: On ‘Dancing through the Minefield’),” Feminist Studies 8, no. 3 (Fall 1982): 636.
- 글로리아 T. 헐(Hull), pp. 193-194.
- [A.R., 1986: 맵 시그레스트 (Mab Segrest), “남부 여성 글쓰기: 온전함의 문학을 향하여 (Southern Women Writing: Toward a Literature of Wholeness),” My Mama’s Dead Squirrel: Lesbian Essays on Southern Culture (Ithaca, N.Y.: Firebrand, 1985).]
- 엘리 벌킨 (Elly Bulkin), 편집, 『레즈비언 소설: 앤솔로지 (Lesbian Fiction: An Anthology)』 (Watertown, Mass.: Persephone, 1981); 그리고 엘리 벌킨과 조안 라킨 (Joan Larkin), 편집, 『레즈비언 시 (Lesbian Poetry)』 (Watertown, Mass.: Persephone, 1981; distributed by Gay Press, Boston, Massachusetts).
- 글로리아 안살두아 (Gloria Anzaldúa), “방언으로 말하기: 제3세계 여성 작가들에게 보내는 편지 (Speaking in Tongues: A Letter to Third World Women Writers),” 내 등골이라 불린 다리 (This Bridge Called My Back), 편집: 체리 모라가 (Cherríe Moraga)와 글로리아 안살두아 (Gloria Anzaldúa) (Watertown, Mass.: Persephone, 1981).
- 아리나 클레피시 (Irena Klepfisz), “레이철 로봇닉의 일기 (The Journal of Rachel Robotnik),” Conditions 6 (1980): 1. [A.R., 1986: Reprinted in Irena Klepfisz,『다른 울타리 (Different Enclosures)』 (London: Onlywomen, 1985).]